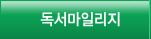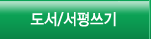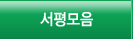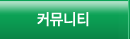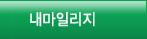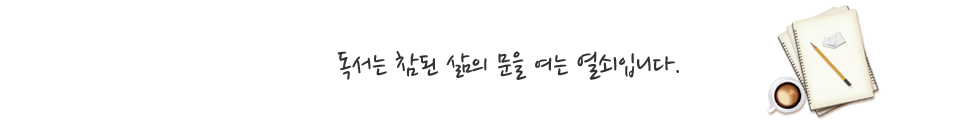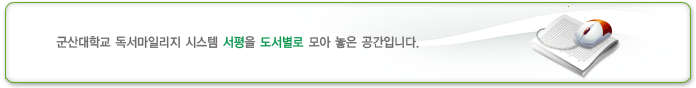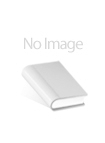> 서평모음 > 도서별서평
> 서평모음 > 도서별서평
| 제 목 | 김수현 기자의 나도 가끔은 커튼콜을 꿈꾼다 | ||
|---|---|---|---|
| 저 자 | 김수현 | 출판사 | 음악세계 |
| 출판년도 | 년 | ||
|
「김수현 기자의 나도 가끔은 커튼콜을 꿈꾼다」 이 책의 저자 김수현은 기자다. 제목에서부터 친절하게 그녀가 기자임을 밝혔음에도 나는 ‘작가 김수현인가’하는 착각을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많았던 걸까? 그녀는 머릿말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이 ‘기자(記者)’ 김수현임을 어필했다. 그동안 이름으로 인해 작가 김수현으로 오해하는 메일을 수차례 받았다는 말과 함께. ‘아차’ 싶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적게는 한 두명부터 많게는 몇 십명, 몇 백명까지 있을 수도 있는데, 편견에 사로잡혀 그들의 인생 자체를 본의 아니게 무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에는 김수현이라는 이름을 듣고 작가 김수현만을 떠올리는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의무감 같은 게 생겼다. 김수현, 그녀는 스스로 글쓰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해서 백일장에 나가기도 하고, 한때는 소설가를 꿈꾸며 문청시절을 거치기도 했다며. 이 책이 머릿말에서부터 내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두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나는 언제부턴가 책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글로 마음을 사로 잡는 것, 그것은 어린 나에게 새로 사귄 친구보다 더욱 황홀한 것이었다. 그래서 막연하게 소설가를 꿈꾸었다. 그 때 내가 생각하는 글쓰는 사람은 소설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의 즐거움은 잠들기 전까지 책을 읽거나, 책 속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지어내 일기로 쓰는 것이었다. 어린 내가 책 읽고 글쓰는 것을 즐겼다면, 그녀는 공연을 관람하고 그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이 행복이었다. 화려한 경력을 지닌 예술가들을 만나 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 것 또한 그녀 삶의 일부분이었다. 예술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진정한 삶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들려주는 진정한 삶의 이야기, 그 생생함 속에는 맑고 순수한 눈물이 한가득 담겨 있었다. 한장 한장 책장을 넘기는 순간 어느덧 내 눈에도 이슬 같은 게 맺혔다. 눈동자 위를 주춤주춤 하던 액체를 ‘뚝’하고 떨어뜨린 건 후천적 청각 장애를 가지고 타악기 연주를 하는 이블린 글레니의 전율이 느껴졌을 때였다. 이블린 글레니와의 인터뷰에서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는 그녀에게 ‘소리가 안들리는데도 어떻게 타악기 연주를 하느냐’는 뻔하고도 식상한 질문을 던진 김수현은 민망하고도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야 하는 기자로서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상처를 더욱 아프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런데도 그녀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을 즐길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의 답은 다음 장을 펼치며 자연스레 알 수 있었다. 그녀에게 공연을 보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았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그녀는 공연을 보고, 또 그것에 감동 받고, 그 여운을 기사로 간직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은 축복이었다. 그녀는 ‘좋은 공연을 본다는 것은 어쩌면 사랑에 빠지는 것과 비슷한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공연을 보며 사랑에 빠지고, 그 이야기들을 연서로 남기는 것. 그것이 그녀가 글을 쓰며 행복해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였던 것이다. 그녀의 행복한 연서는 마치 내가 여러 편의 뮤지컬과 연극, 공연을 직접 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감동의 물결이 온 몸을 감싸안아주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녀가 느낀 행복이 내 마음 속에도 꽃피운 탓일 것이다. 그녀는 공연을 보는 것 만큼이나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었고, 무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만큼이나 가족에게 애틋했다. 방송사고를 막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불러세우고 방송 시작 2분 전에야 간신히 방송국에 도착한 에피소드와 당직인 크리스마스 이브 날 딸과 보낸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송국에 딸을 데리고 가 함께 야근을 한 일화를 보며 그녀의 성품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기자로서도 두 딸의 엄마로서도 10점 만점에 10점이었다. 이제야 그녀가 이 책의 제목에서 커튼콜이라는 말을 쓴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일반적으로 커튼콜은 연극이나 오페라, 음악회 등에서 공연이 훌륭하게 끝나고 막이 내린 뒤, 관객이 찬사의 표현으로 환성과 박수를 계속 보내어, 무대 뒤로 퇴장한 출연자를 무대 앞으로 다시 나오게 불러내는 일을 말한다. 기자가 커튼콜을 꿈꾼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이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 책의 뒷표지를 보면 이런 글귀가 눈에 띈다. 뮤지컬 <명성황후>의 연출가인 윤호진의 말이다. ‘맛깔스러운 정보와 메세지들은 마치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을 대접받는 느낌이다.’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어디있을까?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이름만 들었던 많은 예술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유명한 공연들을 구경하고, 지구 저 편에 있는 영국에서의 삶을 체험하는 일들이 책 한권에서 펼쳐졌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라고. 흔히 그 현상을 ‘회자정리’라고 한다. 하지만 회자정리라는 한마디로 관계를 단정지을 수 없는 건 추억이라는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녀의 책 속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고, 헤어짐도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들을 이어주는 고리가 있다. 그녀는 그 고리를 자신의 맛대로 표현해낸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향상되고 있는 그녀의 요리 솜씨처럼, 그녀의 추억들도 그렇게 제 맛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추억들을 향해 커튼콜을 외칠 것이다.
|
|||

- [54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 국립군산대학교 도서관 TEL:063-469-4187
Copyright(c) 2011. Kun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